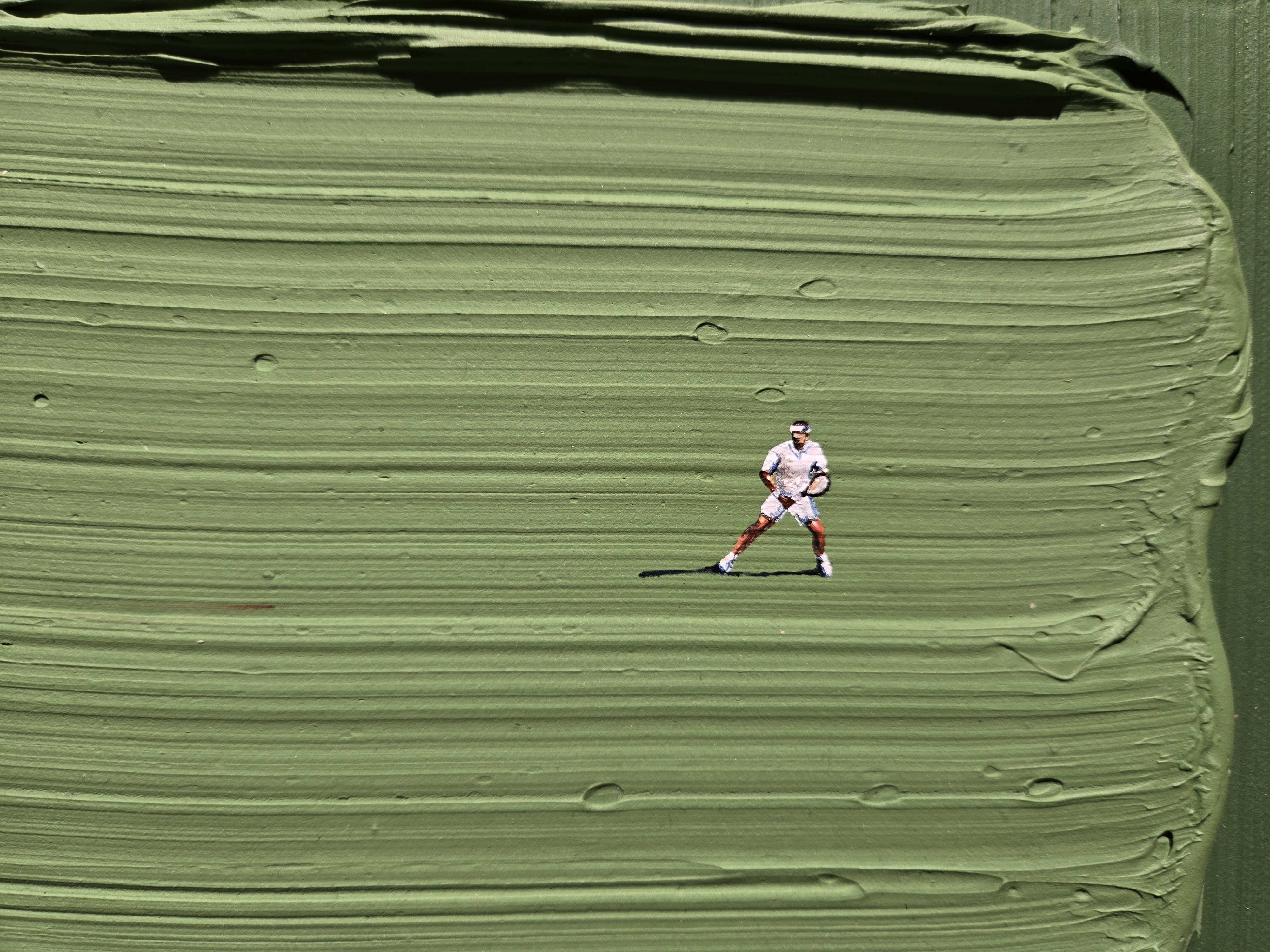⟪스토너⟫를 읽고 난 후, 나의 한줄평 : 이게 뭐라고 계속 읽었는지 모르겠다.
절대 재미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별볼일없는 노교수의 일생을 따라가기가 따분해서 중간에 덮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가 이 책을 완독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다는 말이다. 국물맛은 삼삼한데 계속 먹게 되는, 평양냉면 같은 책이다.
스토너는 참 뭐랄까... 뿌옇게 김서린 안경을 끼고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는 사람 같다.
(워커-로맥스 소동만 제외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불평은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결과에 곧잘 순응하고는 한다. 심지어, 영문학에 대한 열정을 타인(아처 슬론 교수)이 일깨워주어야 할 정도였던걸 보면, 본인의 호불호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드리스콜과의 연애를 사람들에게 잘 숨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장면은 그저 헛웃음이 나오고, '스토너는 사과했다'는 심플한 문장구조 대신 '스토너는 자신이 사과의 말을 또다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 또한 당황스럽다.
읽는 내내 나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매사에 호불호가 강하고, (젊어서 에너지가 남아돌 적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한번 말이라도 해보거나 그것도 아니되면 조용히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노력은 하되) 결과에 순응적이고 심지어 해탈하기까지 한 스토너의 모습들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늙은어부 산티아고와도 닮았다.
스토너처럼 살지는 못하겠고.. 스토너와 같은 친구를 두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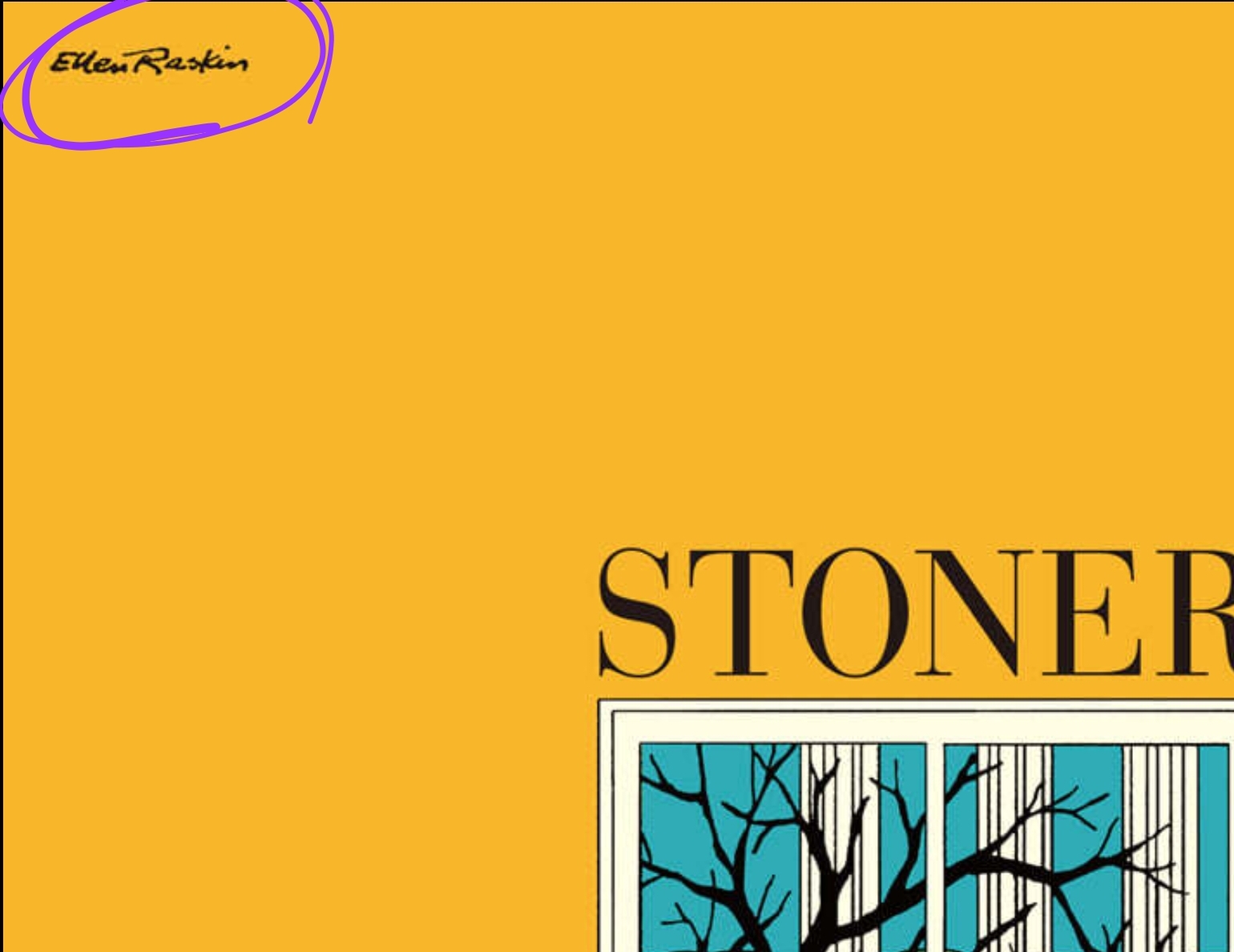
“모르겠나, 스토너 군?” 슬론이 물었다. “아직도 자신을 모르겠어? 자네는 교육자가 될 사람일세.”
갑자기 슬론이 아주 멀게 보였다. 연구실의 벽들도 뒤로 물러난 것 같았다. 스토너는 자신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지.” 슬론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걸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건 사랑일세, 스토너 군.”
슬론이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아주 간단한 이유지.”
- 1장
그해 10월에 주식시장이 붕괴했다. 지역 신문들은 월가에 대해서, 엄청난 재산을 잃고 인생이 변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기사를 썼다. 컬럼비아에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보수적인 동네였으므로, 주식이나 채권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은행들이 도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싹튼 불안감이 몇몇 사람들을 건드렸다. 농부들 몇 명이 저축했던 돈을 인출해 갔고, 그보다 조금 많은 농부들은 (지역 은행들의 다그침을 받아) 예금을 늘렸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작은 민영은행인 머천츠트러스트의 도산 소식이 들어올 때까지는 진심으로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 7장
몇 주 뒤 스토너는 그날 오후에 로맥스가 핀치의 사무실로 쳐들어왔던 일을 핀치에게서 직접 들었다. 로맥스는 스토너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그가 중세영어 상급과정에나 알맞은 내용을 1학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핀치에게 그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핀치는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 동안 웃으면서 간간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웃음이 말을 밀어냈다. 마침내 웃음이 잦아들자 그는 로맥스에게 사과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한테 당한 거요, 홀리. 모르겠습니까? 그 친구는 물러서지 않을 거요. 그리고 당신은 전혀 손을 쓸 수 없어요. 나더러 당신 일을 대신 해달라고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소? 학장이 고참 교수의 강의에 간섭하는 걸로 모자라서, 그 학과의 학과장 선동에 넘어가 그런 짓을 하다니. 그건 안 될 일이오. 그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거요. 그렇지요?”
- 15장
“그런 것이 아니야.” 스토너가 말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걸세.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차분하게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휴식도 좀 필요하고.”
핀치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럴 만도 했다. 스토너는 자신이 사과의 말을 또다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자신이 아직도 바보처럼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 16장
'Book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독평) ⟪트럼프 2.0 시대 : 글로벌 대격변이 시작된다⟫, 박종훈 著 (2) | 2025.05.12 |
|---|---|
| (1독평) ⟪급류⟫, 정대건 著 (0) | 2025.05.01 |
| (1독평) ⟪슬로우 워크⟫, 칼 뉴포트 著 (0) | 2025.04.28 |
| (1독평) ⟪혼자 있기 좋은 방⟫, 우지현 著 (0) | 2025.04.12 |
| (1독평) ⟪나 같은 기계들⟫, 이언 매큐언 著 (0) | 202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