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독 서평)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김지원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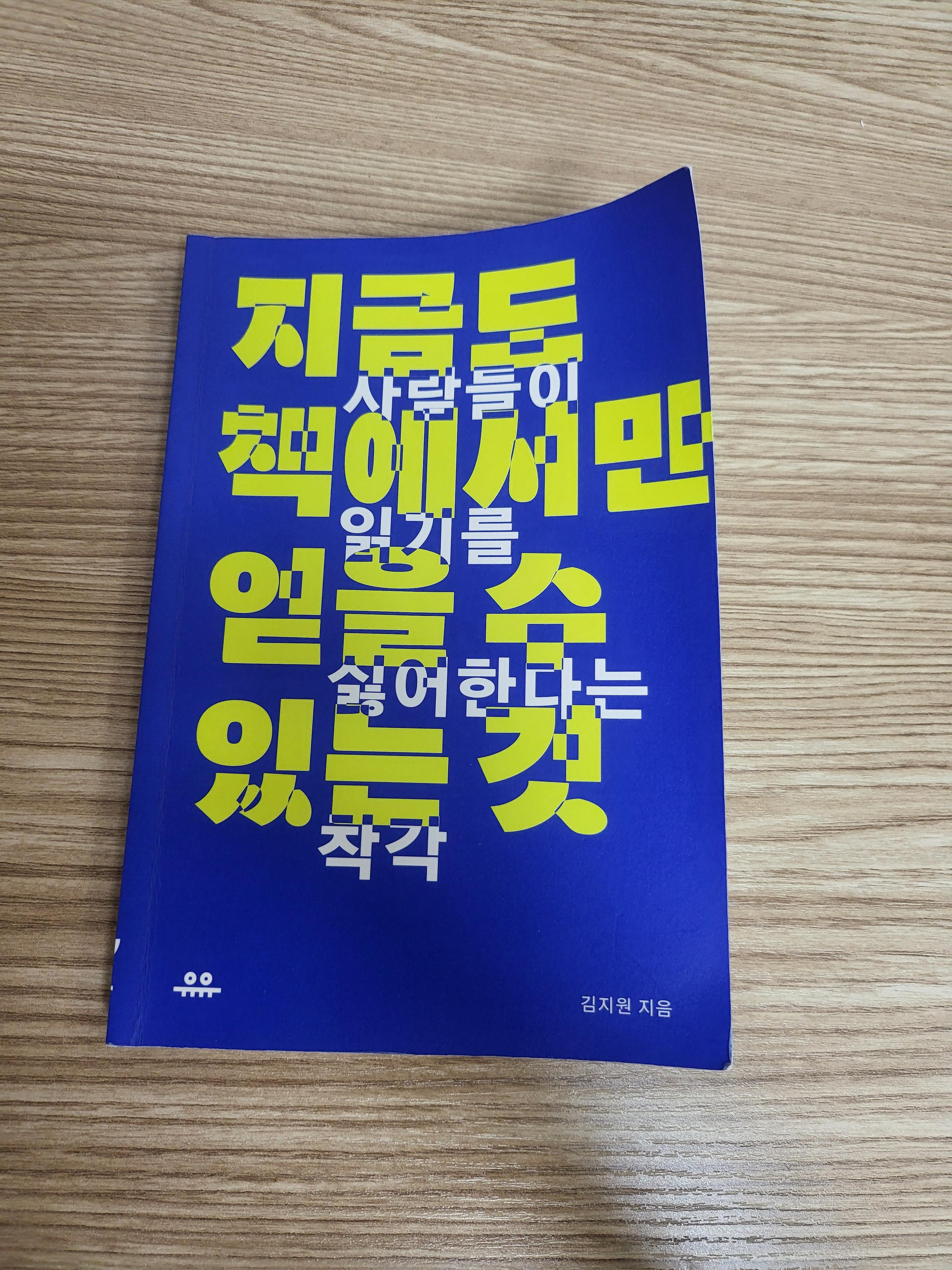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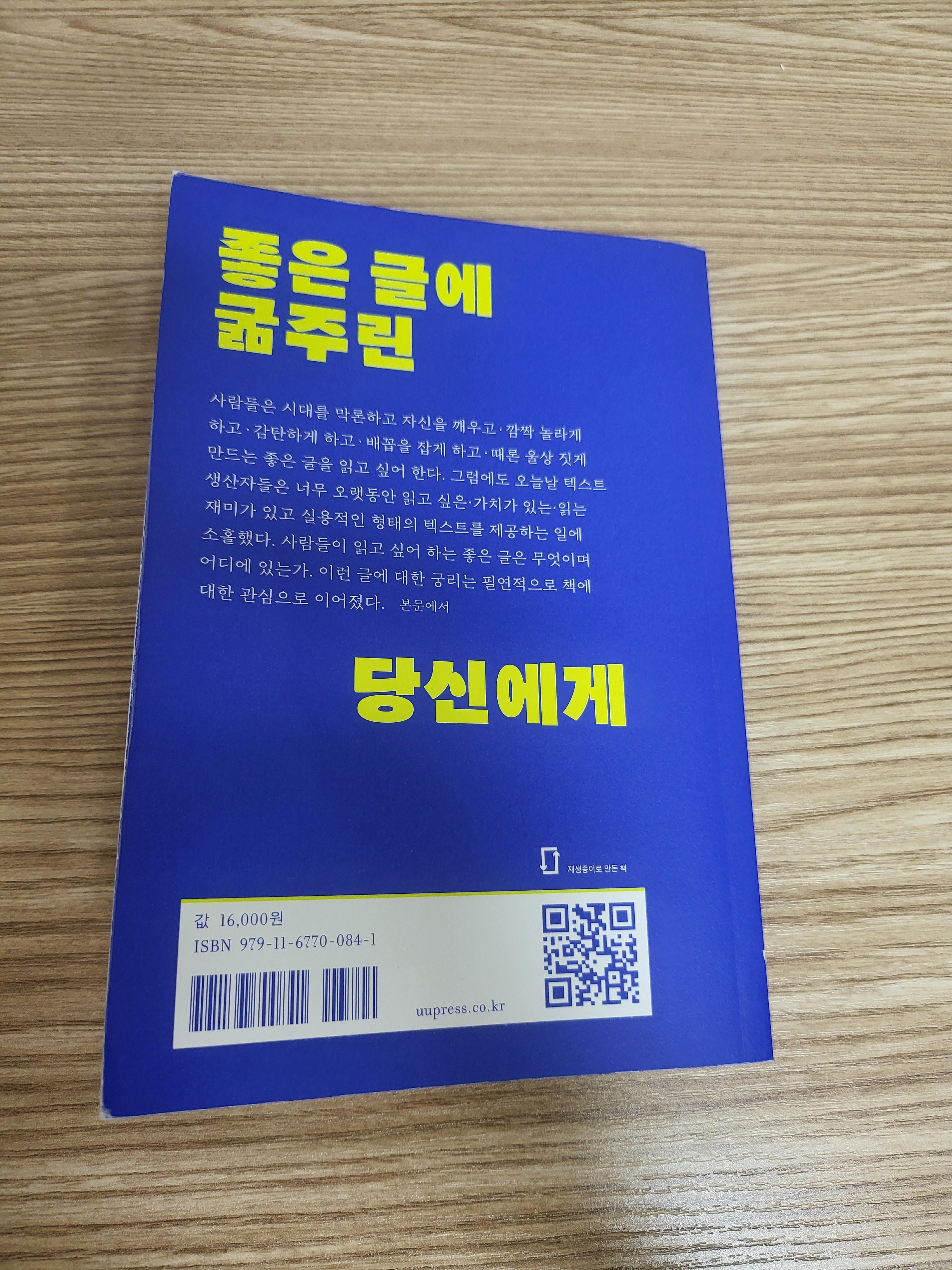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고 갈무리하는지 - 에 대한 주제에 내가 환장하나 보다. 내가 아껴마지 않던 책을 꼽아보자면 아래와 같다 :
- '지적생활의 즐거움', P.G.해머튼 지음, 김욱 편역;
- '약한 연결', 아즈마 히로키 지음, 안천 옮김;
- '아무튼, 메모', 정혜윤 지음.
이번에 읽게 된 책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내 환심을 샀다. 그런 사소한 이유로 집어들었지만, '책을 아껴가며 읽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독하게 된 진실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자 김지원 님의 통찰력이 담긴 문장들 때문이었다. 문단 째로 옮겨 오고 싶은 부분도 많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김지원 님이 '종이책'이라는 특정매체에 주제의식을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이북리더기를 잘만 사용하고 있는 나로서는 종이책만이 가진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책이 어떤 면에서 열등한 것인지(?) 김지원 님의 생각을 알아내고 싶었다.
종이책은 내가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지, 어떤 것은 손쉽게 읽고 버려도 될지, 어떤 정보는 읽지 않고 그냥 지근거리에 두어도 될지를 위계적으로 판단해 정리해 둘 수 있게 한다. 오히려 이 때문에 당장은 읽을 필요가 없는 정보에도 적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사 두고 안 보면 된다.) 어떤 책은 오랜 세월 두고두고 먼지를 뒤집어쓰고서 "서가에 꽂힌 채 나를 노려보"다가, 결과적으로는 먼 훗날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내 인생의 책"이 되기도 한다. 아카다 아키노리는 이처럼 어렵지만 언젠가는 읽어야 하는 책을 당장 읽지 않고 일단 서가에 꽂아 두는 것을 '책 재우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이에 반해 전자 텍스트는 북마크를 해 두어도 간혹 링크가 변경되거나 저자의 변덕 혹은 사이트 장애로 인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 Chapter '책은 다양한 읽기 경험을 돕는 도구다' (p.95 ~ p.97)
수력공학 • 원자력 • 수학 • 농업 등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책, 외국어로 된 서적이 가득 꽂힌 서가를 배회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모르는 세계의 부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상의 읽기에서는 좀처럼 하기 어려운 경험이다. 이 '서가 배회'를 통해 나는 어디에 가면 어디쯤에 어떤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를 어렴풋하게라도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에 관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감각이 생기고, 필요한 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틈날 때마다 굳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다. 아마도 나의 독서 중 20퍼센트는 이처럼 때때로 서가를 이리저리 배회하며 책등을 읽고 내키면 책을 꺼내어 표지를 읽는 '책등 독서'일 것이다.
모든 책을 다 읽을 필요는 당연히 없다. 이렇게 책등이나 서문을 제외하고 '읽지 않은 책'들의 계보를 확장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원하는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 Chapter '책은 믿을 만한 지식의 지도다' (p.109)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종이책은 지식지도에서 내가 위치하는 좌표계를 알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데 그 차별점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종이책의 특장점은 (문헌정보학으로 체계화된)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결부되었을 때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이라면 이북리더기가 한수 접고 들어가야 겠다. 책등읽기라든지 서가배회와 같은 활동은 어려우니 말이다. (그래도 이북리더기 나름의 간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북리더기와 종이책이라는 두 매체를 병행할 생각이다.)
김지원 님의 첫 책이라는데, 앞으로의 저작활동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거운 독서경험이었다. 무릎을 탁 치는 문장을 하나하나 다 옮기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면 책의 거의 대부분을 옮겨야 할 판이므로.. 몇 개 부분만 발췌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우치다 다쓰루는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에서 단순히 쉬운(=대중적인) 입문서를 쓰겠다면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의 예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독자를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며, 상대에게 직접 말 거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독자에게 말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쓰인 글은 비록 어렵더라도, 왠지 모르게 어떻게 해서든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다. 즉 '중2도 이해할 수 있도록 써라'라는 것은 결국 '중2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써라'와 다름없다. 정말로 내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글은 검색을 하고 사전을 찾아서라도 읽게 된다. 단순히 평이한 단어를 쓰고 존댓말을 쓴다고 해서 읽고 싶은 글이 되는 것이 다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 말을 거는 방식의 글쓰기여야 한다.
- Chapter '읽는 맛 • 읽을 가치 있는 • 읽을 수 있는 글' (p.42 ~ p.43)
2023년 이후, 생성형 AI시대에 언론계 및 출판계와 AI 업체 간의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원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자, 인터넷에 대중없이 섞여 있는 수만은 정보(1차, 2차, 3차, 4차, 5차••••••) 가운데 결국 재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는 원천에 가까운 정보라는 것을 방증한다. 만약 AI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라면, 그게 뭐든 무조건 많이 쏟아부으면 된다고 한다면, 굳이 까다로운 샅바까움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Chapter '책은 원산지가 표시된 정보다' (p.81 ~ p.82)
그래서 본래 간결한 글을 좋아하지만, 서문에 대한 취향은 조금 다르다. 서문만큼은 거창하고 방대하고, 때론 장황하고 갈지자로 휘청이고 제 깜냥보다 욕심이 앞서는 글도 싫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서문에서는 자기 삶에 녹아든 질문 • 헤매는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위로 어떻게든 1밀리미터라도 뚫고 나가려는 에너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서문이 실린 책에서는 저자의 미시사와 세계사가 아코디온을 접었다 펼쳤다 하듯 교차한다. 익숙하고 뻔한 것 • 향수를 주는 것 • 누구나 안전하게 동의하는 전통에서 저자가 갸우뚱거리며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순간, 서문은 책보다 더 커진다.
- Chapter '책은 서문이 붙어 있는 글이다' (p.115)